서브메뉴
검색
본문
좀머 씨 이야기
파트리크 쥐스킨트 지음/윤혜자 옮김/장 자크 상페 그림/열린책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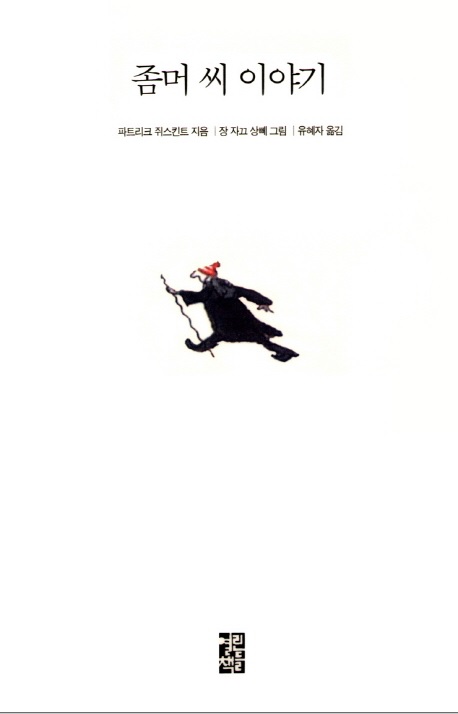
순수한 눈으로 세상을 보며 아름답게 평생을 살 수 있다면…?
쥐스킨트의 문장을 마주하면 순수한 눈을 닮을 것만 같다. 그의 눈을 빌려 세상을 한번 바라보자.
유년기에 대한 기억은 회귀할 수 없기에 그립고 아쉬운지도 모르겠다. 세상사를 이해하기 어려울 때 동경심과 경외심으로 무모할 이만큼 도전적인 자아는 꿈과 낭만으로 건강했다. 그때를 설명하는 방법이 서툴러 표현하기가 벅찼음에도 작가 쥐스킨트는 여느 사람들처럼 굳이 언어로 옮기려 했을까? 어찌 보면 그는 말을 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지혜를 알려 주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이 좀머(sommer)를 부를 때 이름에서 연상되는 ‘여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대명사 ‘그’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아 보인다. 호칭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옆집’이나 ‘이웃’이라고 불릴 법한 사람인데도 이름을 부르고 특칭을 사용하는 일은 인간관계상 서로 존중하는 의미로 입을 통해 전달하는 문화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굳이 언어를 써서 표현하려는 까닭도 그러할까?
남과 다름을 인정하는 자아는 몇이나 될까? 대부분은 사람을 대하면서 본보기가 되는 삶을 닮으려고 하거나, 어떤 장소에 누구와 함께 자리해 있다는 사실을 긍정하면서 같아지려고 하게 마련이다. 특이한 좀머 씨에 대한 기억을 마음속에 품은 사람은 어린이였다. 그 어린이가 장성했을 때 좀머 씨는 스스로 사라졌지만, 어린이에게라도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믿게 된다. 어린이의 눈에만 머물렀어야 하는 까닭이라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러할 법도 하다. 정말 그렇다면 어른의 세계에서 지켜져야 할 비밀이란 없고, 마을에 도는 이야기 모두 들통나 버리는 것이 부끄럽거나 두려울 테니 조용했던 좀머 씨를 이상한 사람으로 여길 필요가 없다.
작품 속의 화자인 어린이는 순수하면서도 매우 치밀한 구석이 있다. 좀머 씨에게 다가가는 것에 거리낌이 없어도 그와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면 좀머 씨의 매력에 사로잡혀 있었을 테다. 무언가 감추고 싶어 하는 것이 있었다거나,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수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갖게 했기 때문이다. 어린이의 눈에는 좀머 씨의 숨겨진 이야기가 보였던 것이다.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는 본래 새로 이사를 오거나 잠깐 방문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다. 아름다워 보이는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욕심도, 아름다운 말에 대한 욕심도 갖지 않기 때문에 서로 관심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조차 대단한 부로 여긴다.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일수록 빽빽하고 냉정한 가슴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시골을 방문할수록 유연해지는 성격을 마주하면 당혹스러워지기 쉽다. 좀머 씨가 마을을 찾아온 것은 마을 밖의 어딘가에서 힘겨웠던 시간을 견디다가 도망치듯 찾아온 사실을 함축하고 있으리란 예상을 하게 된다. 좀머 씨의 침묵이 어린이의 관심을 살 만큼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때로 침묵할 필요를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말하지 않아도 무엇을 말하려는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있지만, 그것을 마음에 품은 대로 온통 쏟아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다. 아니 말할 수 없는 것이거나 말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느끼는 때가 있는 것이다.
좀머 씨가 어디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물론 그가 그러한 곳에 왔으리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어린이에게 그는 동경의 대상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어린이는 어른들이 아는 세상을 감추어 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어른으로서 함구해야 할 때는 어린이의 재롱에라도 마음을 뺏기고 싶어지는 것이다. 무엇에 몰두해 있으면 기억하고 싶은 것으로부터 피할 수 있게 되므로 마음의 평화가 온다. 그래서 어린이의 말붙임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 그것도 한순간! 어린이는 점점 어른이 된다. 어린 시절을 잊어버리는 어른이 되고 만다. 세월이 흐르듯이.